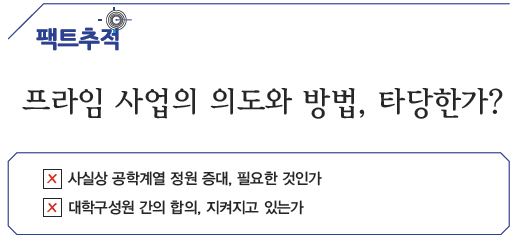
프라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학정원의 5~10% 또는 100~200명 이상을 취업에 유리하거나 미래에 경쟁력 있는 학과로 편성·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학 ▲예체능 ▲의학 ▲인문사회 ▲자연과학으로 나뉜 총 5개 계열 내에서 학교 정원을 조정해야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계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의학계열은 법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공학 분야의 사회적인 수요가 높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학과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예체능, 인문사회, 자연과학계열의 정원을 공학계열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사회수요 예측에 따라 학과를 개편하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교수신문의 논설위원인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사회수요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열별 인력수급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공자가 꼭 관련 분야로 진출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학 계열의 정원 증대가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학 전공자 비율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미국과학재단의 ‘2014년 과학 및 공학 지표’를 재편집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학 전공자 비율은 23.9%로 중국(31.4%)을 제외하고 일본(16.6%), 영국(6.3%), 미국(4.5%)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내세운 프라임 사업의 3대 원칙 중 하나는 ‘대학 구성원 간 합의’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몇몇 대학은 구성원들과 충분한 합의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대는 사업 계획서 제출 마감 하루 전인 30일에서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연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화여대의 경우는 프라임 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학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학생들이 돈을 모아 학교의 미래를 우려하는 마음을 담아 학교 정문에 ‘근조화환’을 늘어놓았습니다.
몇몇 대학들이 앞선 사례들처럼 학내에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프라임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프라임 사업의 세부 평가지표에서 드러납니다. 이 평가지표를 보면 5가지의 항목 중 ‘정원감소 분야 대책 및 대학 구성원 간 합의’에 배정된 점수는 10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이 항목의 세부 기준을 들여다보면 ‘대학 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 유도 방안’에 3점이 배정됐습니다. 학과 개편에 관련된 항목의 배점이 30~40점인 것과 대조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프라임 사업이 적절한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대학교육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구조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연 수습기자 rhee352@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