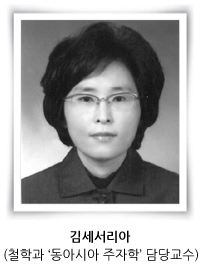
솔직히 나에게 공자는 초월적이거나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가 전해주는 언설들로부터 무한한 감동을 받고 수많은 교훈을 얻지만, 그것이 어떤 초월성이나 신비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나에게 공자는 현실의 삶을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위대한 사상가임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나 역시 그를 ‘성자(聖者)’로 호칭하지만, 거기에는 초월, 신비, 숭배의 이미지는 담겨져 있지 않다. 그보다는 성자의 聖자를 耳 + 口 , 즉 ‘귀 달리고 입 달린’, ‘세속적인’의 의미로 해석한다. 혹자는 공자를 대하는 이러한 나의 태도를 공자의 가치에 물 타기하는 것이라 비난한다. 하지만 어떤 신비감이나 초월성, 혹은 숭배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을 벗어나서 공자를 대할 때, 현실 감각이 뛰어난 공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공자를 화석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35년 공자와 인연을 맺으면서 얻은 나의 결론이며, 내 나름의 공자 사랑법이다.
현대 사회에서 전통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통과 현대 사회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는 아주 반대로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결별하는가의 지점을 찾는 작업일 수도 있다. 인(仁), 효(孝), 친친(親親), 조화(和), 음양(陰陽) 등의 유교적 개념은 단지 칭송받기 위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현실과 만나기 위한 표지와 지침들로서 우리를 향한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현실의 무대로 나서게 하는 일, 그것이 비록 모험일지라도 그 모험은 이제 단행돼야 한다. 왜? 우리가 미래에 서 있을 자리는 이제껏 우리가 서 있어왔던 자리, 혹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보다 훨씬 나아야 하겠기에.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사안을 ‘유교적’이라는 주제 하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거나 혹은 유교 경전의 의미를 ‘오독’ 혹은 ‘오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오독과 오용이라면, 그 의도된 오독과 오용은 새로운 것, 지금 여기에 의미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자가 말한 의미를 잘 이해하는 노력과 더불어, 그것을 비틀고 거꾸로 읽어서 의도적인 오독과 오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주 많은 시간의 간극을 지니는 공자는 그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
김세서리아(철학과 ‘동아시아 주자학’ 담당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