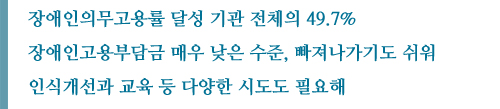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은 3%이며 민간기업은 2.7%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미고용인원에 비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전체 기관 및 기업의 47.9%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9년 이후 작년까지 7년간 3%를 넘어선 적이 없고 민간부문 역시 같은 기간 최고치가 2.51%에 불과했다. 특히 상용노동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2.07%)은 평균보다 낮았고 30대 그룹(1.92%)은 더 낮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부담금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담금 수준은 실질적으로 의무이행 강제수단으로서의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미달시킬 경우 1명당 부담금으로 최소 월 75만 7000원, 최대 월 126만 270원을 내야한다. 이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인 132만 320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월평균임금보다 부담금이 낮다 보니 사업주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내려한다. 이는 기업들이 고용의무로부터 빠져나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금이 낮다는 주장 이외에도 의무고용률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낮은 편이다.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은 각각 5%와 6%이다. 고용노동부의 ‘적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 가능인구 비율에 따른 적정 의무고용률은 4.3%로 현재 의무고용률인 3%보다 1.3%p 높은 수준이다.
의무고용률을 할당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장애인을 한시적 근로자 혹은 단기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해 의무고용률을 채운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의무고용률만 달성해도 제도의 법정 기준은 충족한 것이기에 해당기관을 처벌할 수 없다.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 함에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다. 따라서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글.삽화_ 김도윤 기자
ehdbs7822@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