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1998년 영화 <가타카>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빈센트’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족한 신체조건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DNA 중개인 ‘게르만’을 만나 우성 유전자를 사게 되고 빈센트는 뛰어난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유전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가타카>, 98년의 관객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영화였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한미 공동 연구진이 비후성 심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 교정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란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자르거나 더하는 기술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특정 DNA를 찾아내는 RNA인 ‘CRISPR’와 DNA를 잘라내는 ‘Cas9’ 단백질로 구성된 절단 효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라 불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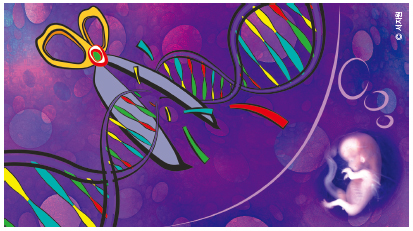
기술의 시작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최초로 징크핑거 뉴클레아제를 이용한 1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발된 2세대 유전자 가위도 유전자 하나를 잘라내려면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렸고, 비용도 비쌌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단 며칠이면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잘라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구진이 빈혈 유발 유전자를 제거하는 인간배아실험에 성공해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허가 없이도 인간배아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도 인간배아를 이용한 유전자 연구를 허가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승인하에 실험이 가능하지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에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대학 생명과학과 이동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유전자 가위 연구 수준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중간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 교수는 “호기심의 충족을 위한 무책임한 인간배아연구는 지양해야 하지만 유전병 등의 불치병 연구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라며 허가제와 같은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험의 주제도 논의의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맞춤형 아기’ 입니다. 이 기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기가 병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 가위로 해당 유전자를 없애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대학 철학과 목광수 교수는 “현실에서는 치료와 (우생학적) 향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라며 “맞춤형 아기는 특정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로 규정하고 장려하는 우생학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목 교수는 우생학적 위험성이 우리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을 폄하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예로 ‘청각장애 유전자를 제거하는 방식이 옹호되는 사회’를 제시합니다. 이 사회는 청각장애인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미 공동 연구진의 비후성 심근증 연구로 돌아갑시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기술을 연구할 수는 있었지만 실험할 수는 없었고, 결국 실험은 미국에서 이뤄졌습니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을 피해 실험을 진행한 한국 연구진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우리 앞으로 바짝 다가왔고, 기술이 가져온 윤리적 고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미래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기술에 끌려다니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임하은 수습기자 hani1532@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