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를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담는 그릇인 플랫폼의 변화도 야기한다. 이에 발맞춰 기업도 발전해야 하기에 기업은 나름대로의 고민이 깊어진다. 한 번 삐끗하기라도 하면 회사가 망하니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레거시 미디어’라 불리는 정통 언론사들도 고민에 빠졌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모바일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며 종이신문과 TV 방송보다 모바일로 뉴스를 보는 독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레거시 미디어, “뭘 해도 안 되더라”
언론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저널리즘의 미래는 올해로 3회를 맞은 미디어 컨퍼런스다. ‘플랫폼 레볼루션과 콘텐츠 에볼루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손석희 JTBC 앵커를 비롯한 29명의 연사들이 참여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는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새로운 화두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다”며 “한국 언론에 ‘뭘 해도 안 되더라’와 같은 짙은 무력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종이신문 구독률과 텔레비전 뉴스 시청률의 눈에 띄는 하락과 동시에 모바일 플랫폼의 급격한 부상 때문이다.

그러나 저널리즘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폭발적으로 새로운 콘텐츠 문법과 모든 플랫폼이 폭발하는 시기에 (저널리즘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콘텐츠를 갖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열려있다”고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혁신을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다 죽는다”며 “저널리즘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이제 독자들을 찾아가야하는 시대”라고 했다.
레거시 미디어들의 현실과 도전
SBS 미디어비즈니스센터 김혁 센터장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기에는 위기가 너무 명확하다고 말한다. 그는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위기다. 온갖 수를 써서 총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 수익으로 여겼던 광고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작비와 같은 콘텐츠 생산비용은 급증해서 순이익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인 ‘옴니채널’의 등장으로 미디어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들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거기에 광고를 삽입해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며 수익을 얻어왔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수요 맞춤형 공급 ‘온디멘드(on demand)’가 가능해지며 기존의 일방적 콘텐츠 제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김 센터장은 “주는 대로 받아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골라서 보고 듣는 시대로 바뀌어 나간다”며 현실을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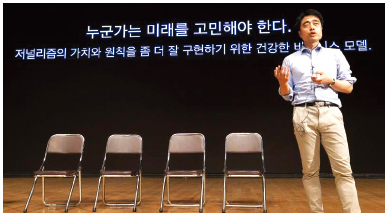
데이터 저널리즘 실험과 시행착오에 대해 이야기한 마부작침팀의 권지윤 기자는 우리나라 25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을 찾아 보도했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58곳 정도가 무변촌이었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1명이 (국민) 15만명을 상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변호사가 전국에 제대로 포진돼있지 않는 등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 아니면 불가능한 아이템인 것 같다”고 했다. 이정환 대표는 SBS 마부작침팀에 대해 “척박한 국내 데이터 저널리즘 환경에서 가장 본질에 다가간 데이터 저널리즘을 실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은 디바이스, 스피릿은 아니야”
디지털 혁신 속 레거시 미디어들이 변화를 따라잡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저널리즘의 본질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혁신과 저널리즘의 결합 이전에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이 늘어났지만 아날로그적 토픽, 원칙과 기본, 상식의 회복이 없다면 (저널리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디지털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정보도와 같은 저널리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흉기와 같은 보도와 시사프로그램들이 날마다 나온다”며 “원칙과 상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그랬듯) 디지털 시대에도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정리하면서 이 대표는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문법과 스토리텔링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저널리즘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준수 기자 blueocean617@uos.ac.kr
사진제공 미디어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