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문 당선작>
아버지와 나는 늙은 자개장 하나 옮기는 게 벅차다
들어온 것을 내보는 건 왜 이리 힘이 들까
자개장이 내린 뿌리를 쳐내다 문턱에 발가락을 찧었다
여기에 오래 있고 싶나보다
여기가 오래 있었나 보다
자개장만 나가면 이곳은 빈집
천장을 받치고 있던 이것만 사라진다면
우리의 가계는 텅 빈 채 무너지겠지
내가 박살 낸 문고리처럼 열면 열리던
기억들이 먼지에 쌓여가겠지
우리는 언제까지 둥지를 옮겨야해요?
위태로운 가지에 모여 있는
까치들이 물음을 쪼는 동안
우리는 맞지 않는 문에 자개장을 맞추려했다
균형 없이 흔들거리는 대화의 무게
아버지로 기울고 나에게로 기우는 수많은 상처들
이가 나간 목재의 생채기는 내가 걷어찬
아버지들, 주름들, 잔소리
자개장을 들어내고 나는 보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동화책 한 권
빵조각을 버리며 제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
나는 버릴 수 없는 가구인가요
나는 마지막으로 옮겨야할 이 집의 명패
당신과 유일하게 닮은 나의 성씨는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를 따라
이어지는 가보처럼
낡은 자개의 무늬처럼
희미해지는 표정
아버지는 문을 나가려 점점 낮아지네
나에게로 쏠리는 무게를 견디며
나도 아버지에게 맞춰본다
자개장을 마당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면
낮은 문턱을 넘어
빵 조각을 이고 가는 개미들의 행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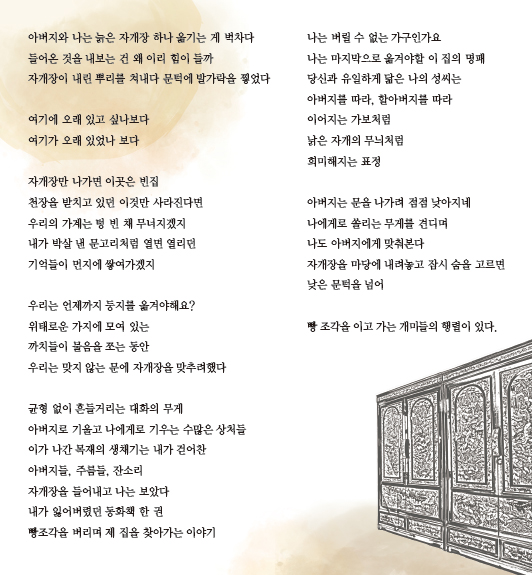
관련기사
용산고등학교 김지용
press@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