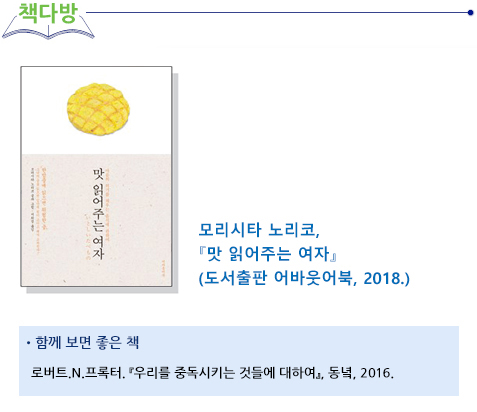
‘맛없을 거야’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평생 입에도 대지 않았던 음식에 푹 빠지기도 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상상하며 그리워하기도 한다. 어렸을 때 횟집에 가면 회 한 점 맛보기를 거절하고 메추리알만 까먹곤 했다. 부모님은 그런 나에게 항상 “나중에 크면 ‘이 맛있는 음식을 왜 억지로라도 먹이지 않았어요?’하고 원망하는 날이 올 거다”라며 호언장담을 하시곤 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내가 지나친 수많은 회 접시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반대로 ‘랍스터’라는 멋진 서양 이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꽂혀 먹어보지도 않은 랍스터를 그리워하던 기억도 생생하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음식사(史)를 만들며 살아간다. 어떤 음식을 보면 우리는 그 음식의 첫인상과 첫 한 입, 재발견했던 맛의 기억, 함께 먹었던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린다. 『맛 읽어주는 여자』의 저자 모리시타 노리코의 추억을 따라다니다 보면 음식은 단지 한 그릇,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양갱을 먹으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인스턴트 라면을 먹으며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린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돈까스에는 꼭 우스터 소스를 뿌려먹어야 한다든지, 우스터 소스는 얼마나 복잡한 역사의 산물인지 설명하는 일도 놓치지 않는다.
‘기름에 튀기는 소리와 신선한 기름 냄새, 알맞게 옅은 갈색으로 구워진 히레까스는 튀김옷이 바삭바삭 살아있었다. 뜨거울 때 도마 위에서 쓱싹쓱싹 칼로 잘라 접시에 담고, 그 곁에 양배추 채를 듬뿍 얹었다. (중략) 적당히 소스가 묻은 튀김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다. 소스가 스며든 부분은 튀김옷이 젖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바삭한 상태 그대로였다. 입에 넣는 순간 달콤한 향과 튀김 기름의 향기로움이 동시에 전해졌다. 그리고 바삭!’
우리대학 학생이라면 돈까스만 보면 학교 앞 수많은 돈까스 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흔하디 흔한 돈까스도 저자의 글을 거치면 생기를 발산한다. 책 표지에는 ‘한밤중에 읽으면 위험한 글’이라는 무시무시하지만 적절한 문구가 적혀있다.
저자는 본인이 평생 먹어온 평범한 일본 음식을 다룬다. 라면, 카레, 오므라이스, 양갱, 고로케, 주먹밥 등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음식이다. 일본에서 수입된 ‘바몬드 카레’라는 상표 이름과, 중불에서 카레 가루와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끓여낸 밥 위에 올려먹는 카레가 그렇다. 작가는 다음 날 카레를 다시 데워 밥 위에 뿌리면 재료는 물러있고 카레에서는 더 진한 맛이 난다고 표현한다. 저자와 비슷한 추억을 마주하면 흐뭇한 마음이 든다.
임하은 기자 hani1532@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