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기 독자위원회 _제724호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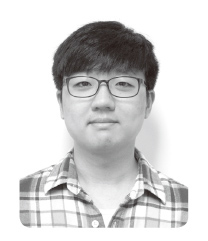
서울시립대신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다음부터 잘하자’는 마음이 관성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점이다. 한 호를 마감하고 나서 드러난 문제를 짚었지만 다시 또 마감을 마주하며 이전의 그 문제들을 잊어버리거나 도저히 고칠 수 없어 애써 무시하는 굴레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그러니 짚은 문제를 또 짚고 또 짚어야한다. 사진 기사는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고 기사들의 깊이는 제자리다. 총학생회 선본을 ‘열일’이 아닌 ‘너나들이’라 표기하는 사설이나 틀린 조사를 사용하고 있는 기사 속 문장들은 오탈자를 잡아내지 못하는 조판 구조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하나의 기사를 축조함에 있어서 문제를 만들고 이를 지적해야 한다는 집착이 느껴져 억지스러운 느낌이 다분하다. 동시에 기사 속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산발적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카풀과 택시에 대한 기사의 경우 그 둘을 모두 이용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자의 체험기 느낌이 강해 카풀이 불법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쳐내야할 잔가지처럼 보인다. 정신질환자와 관련해서는 신화와 법에 관한 이야기가 결론에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과 어떻게 연결지어지는지 의문이다. 공간 부족을 지적하면서 소모임의 열악한 환경을 드러낸다는 것은 소모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조일 것인데 학교가 동아리도 아닌 소모임을 지원해야하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를 지적했으면 기자가 그것이 왜 문제인지 설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보다 기사들이 독자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독자들이 기사에 다가가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따로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다. 총학 인터뷰에서는 독자들에게 선본의 공약에 대한 해설 없이 그저 본인들이 했던 인터뷰를 그대로 제시한다. 친절한 설명이 없다면 독자들은 그대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없다.
김준수(철학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