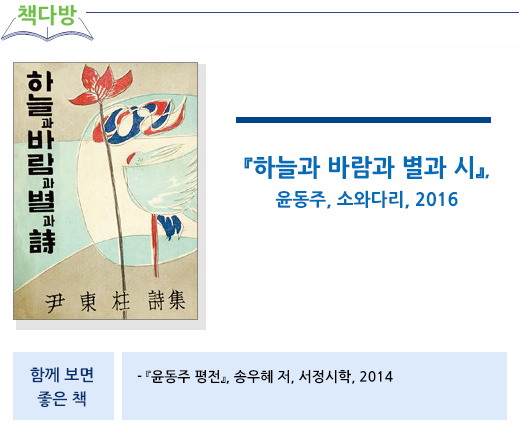
어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변명은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닐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은 자신이 외면한 문제의 잔여물쯤으로 여겨질 것이다.
예컨대, 일제의 국권침탈에 잠시 분노하다가도, 금세 ‘조선민족의 장래를 위해 식민지배는 불가피하다’거나 ‘일제의 지배가 오래갈 것 같아 체제에 순응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결여된 것은 논리적 사고라기보다는 반성적 사고다. 이들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에서 당당했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일제치하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었다.
이들처럼 기울어진 세상에 맞춰 스스로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내 기울어진 세상과 불화(不和)하며 자신의 양심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인 윤동주 역시 그 중 한명이었다. 일제치하는 윤동주에게 어두운 시대였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써 그가 느낀 주된 감정이 ‘부끄러움’이였던 것은 놀랍지 않다.
윤동주의 시에는 그의 부끄러움을 형상화한 구절이 자주 나온다. 윤동주는 길 위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한 것에서 (「길」),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에서 (「쉽게 씌여진 시」), 젊은 나이에 너무 단정적인 고백을 해버린 것에서 (「참회록」)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부끄러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존재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상황과 무관하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적어도 윤동주에게 있어 일제치하는 ‘어쩔 수 없는 일. 그래서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니었다. 윤동주는 잘못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시를 씀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 과거 식민지배의 상흔은 어느정도 씻겨 내려간 듯도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회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의 부조리들을 ‘어쩔 수 없다’는 판에 박힌 말로 묵인한다.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으니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러므로 문제는 여전히 ‘부끄러움’이다. 잘못된 것을 보고 느끼는 부끄러움, 그 감정이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김세훈 기자 shkim7@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