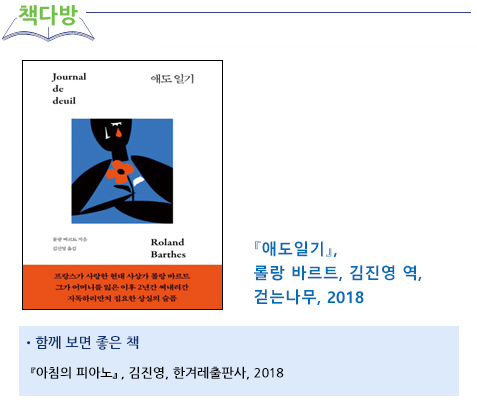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는 프랑스의 평론가이자 기호학자인 저자가 1977년 10월 25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약 2년 동안 써내려간 일기다. 일기에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어머니를 잃고 그가 겪었던 슬픔의 잔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기는 1977년 10월 26일 “결혼의 첫날밤. 그러나 애도의 첫날밤인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로부터 약 2주가 흐른 뒤, 그는 이렇게 쓴다. “허우적거리면서 나는 겨우겨우 슬픔을 건너가는 길을 찾아나가고 있다”(1977년 11월 9일). 그는 이제 상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추스르게 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는 3개월 남짓한 기간이 흐르고 쓴 일기에서 어머니를 잃고 앓게 된 기관지염을 생각하며 “아침 내내 끝없이 마망(어머니) 생각. 이런 우울은 싫다.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불변의 상태에 대한 혐오감”(1978년 2월 21일)이라고 적는다. 3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는 슬픔 안에 있다. 1차 애도일기의 마지막 날 그는 “이제 예민한 감수성이 다시 돌아온다. 애도의 슬픔이 시작됐던 그 첫날처럼 생생한 느낌이.”(1978년 6월 21일)라는 말로 일기를 마무리 한다. 결국 그에게 애도일기는 상실을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실을 견디다 못해 쓴 “비명”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삶에 지친 독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책들은 많다. 그런데 그런 책들의 상당수는 상실을 성장의 한 과정으로 소모해버린다는 인상을 준다. ‘현재진행형’이 아닌 ‘과거’가 된 상실을 다루는 책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책들의 저자들은 상실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 덤덤하게 고백할 정도로 이미 상실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애도일기』는 상실 극복 이후가 아닌 상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저자인 롤랑 바르트에게 상실 극복 이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상실에 관한한 “망각이란 없다. 이제는 그 어떤 소리 없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1979년 1월 30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떨쳐내지 못하다 1980년 2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별다른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죽는다. 한 사람이 슬픔에 잠겨 죽어간 기록인 『애도일기』는 ‘현재’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김세훈 기자 shkim7@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