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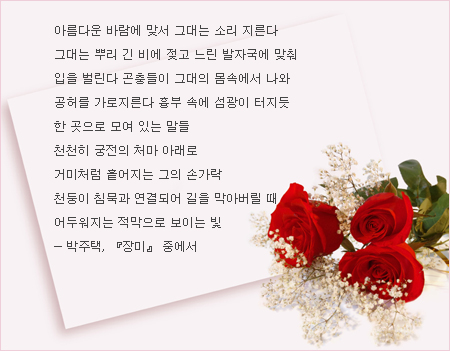 |
비록 근래의 일만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화두가 탈근대화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근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 동시에 근대성과 끊임없이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 시인은 그러한 시류에 전혀 휩쓸리지 않은 채 눈(眼)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려는 그 수련의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보석들이 탄생하리라. |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