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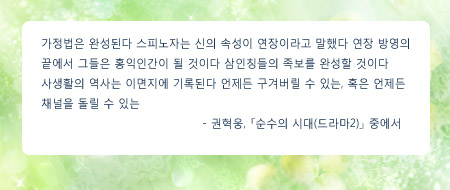 |
혹 아직도 문학에서 숭고미를 기대하는 이가 있다면, 권혁웅의 시는 읽지 않아야 한다. 그의 시에서 천상의 아름다움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빈자리에서 영화나 만화의 캐릭터가 부활하곤 하기 때문이다. 추억의 ‘마징가’를 숭고하게(?) 되살리기도 했던 그 아니던가. 위 시편도 그러한 시적 설정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그가 우리 삶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찾아낸 것은 ‘드라마’이다. 그는 드라마라는 한 매체 속의 이야기를 ‘순수’ 혹은 ‘순수의 시대’라 규정한다. |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