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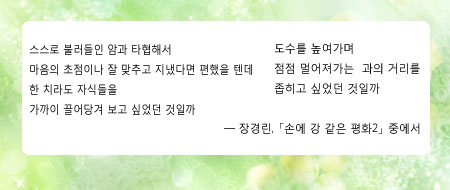 |
문득 웃음이 났다. ‘손에 강 같은 평화’라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찬송가 한 구절이 맴돌아 입가는 소란스럽기까지 하다. 아뿔싸! 웃음이 잘못 나왔다. 이 시는 해학이 아니다, 차라리 추도에 가깝다. 위 시의 첫 머리는 이렇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시적 화자는 유품을 뒤적이다 안경알을 깨뜨린다. 그리고 텅 빈 안경테의 비어있는 한 단면, 렌즈가 사라진 자리에서 모성(母性)을 발견한다. 생전의 어머니가 자식을 가까이 하기 위해, “가까이 끌어당겨” 보기 위함이었노라 생각한다. 그래, 시적 화자의 말마따나 마음의 초점이나 잘 맞추고 지냈다면 편했을 텐데! |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