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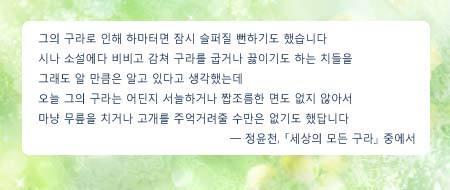 |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낯선’ 경험이지요. 살갑게 인사하고 돌아서다가, 문득 뒤돌아서는데 그녀가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내 사람이 나의 것이 아니라 혹 그녀의 것은 아닌지 되물었지요. 어쩌면 나도, 그녀도 아닌, 누군지조차 모르는 이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니겠습니다. 시뮬라크르(헛것들)의 시대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인데. |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