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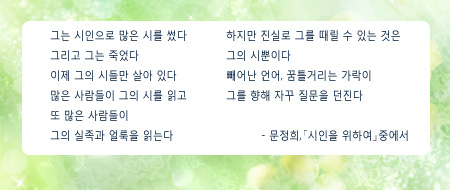 |
‘과잉의 시대’, 이름도 많지만 어쩌면 요즘은 ‘해석 과잉의 시대’인지도 모를 일이다. 한 마디 말보다 거기에 붙는 주석(註釋)이 더 많은 그런 시대 말이다. 문정희의 시인을 위하여는 그러한 세태에 부쳐진 시로 읽힌다. 시인의 죽음 앞에 바쳐진 수많은 말들! |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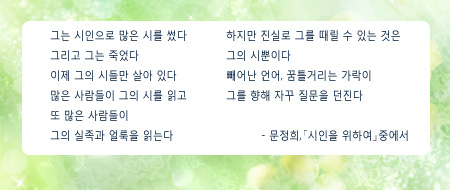 |
‘과잉의 시대’, 이름도 많지만 어쩌면 요즘은 ‘해석 과잉의 시대’인지도 모를 일이다. 한 마디 말보다 거기에 붙는 주석(註釋)이 더 많은 그런 시대 말이다. 문정희의 시인을 위하여는 그러한 세태에 부쳐진 시로 읽힌다. 시인의 죽음 앞에 바쳐진 수많은 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