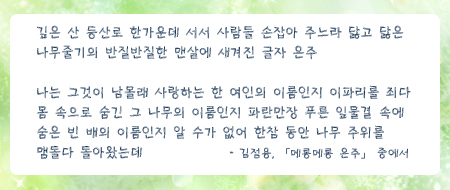 |
모든 게 오후의 나른함 때문이었을는지 모른다. 어느 월요일 오후, 자존심에 대해 생각하며 걷고 있는데 유달리 빛나던 햇살이 뒷목을 쪼아댔다. 그리고 이내 생각은 저런 햇살 아래라면 죽어도 좋겠다는 데까지 이르렀다. 참 오랜만에 자살에 대해 생각한 날이었다. 혹 나는 그때 산책로 옆쪽에 피어있던 목련을 보았을는지 모른다.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상념에 빠져들었다. 세상이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지자 그녀가 보였다. 은주! |
박성필(교양교직부 글쓰기교실 강사)
webmaster@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