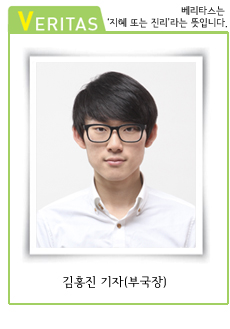
학우들은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강의정보를 공유하기에 여념이 없는 개강 첫 주를 보냈다. 누군가는 강의를 ‘버리기’도 하며 누군가는 빈자리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쉼 없이 마우스를 클릭한다. 매 학기 반복되는 수강신청정정기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런데 이런 풍경 속에서 오고가는 대화가 이상하다. “그 강의 학점은 잘 줘?”, “과제는 얼마나 돼?” 같은 언뜻 보기에는 상식적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오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좋은 강의’의 기준이 ‘얼마나 쉽게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가’와 ‘과제의 분량과 난이도’가 돼버렸다. 강의 선택의 기준은 모두가 다를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본인의 학문적 관심사가 돼야 마땅하다. 일면 구태의연해 보일 수도 있는 말이지만 대학은 어디까지나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곳이고, 대학생은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과제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면 애초에 대학 진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취업에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구차한 변명 뒤에 숨을 필요도 없다. 취업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차라리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보는 편이 여러모로 낫지 않겠는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가끔 ‘이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를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우리대학의 수업에 불만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이 궁금할 뿐이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수업의 방식이나 수준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오직 학점을 잘 주는지, 과제가 별로 없는지만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은 대학 강의의 수준 자체를 하락시킨다. 대학사회 전체의 학생들이 오직 저 두 기준만을 좋은 강의의 척도로 삼는다면, 강의평가와 수강학생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교수자도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는가?
졸업이 코앞이라서 듣기 싫은 과목을 선택했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공부하다 보니 졸업하게 되는 것이지 졸업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느린 볼 투수’로 유명했던 톰 글래빈의 명언인 “야구에 대한 열정은 스피드 건에 찍히지 않는다”는 말처럼 학점과 학문에 대한 이해도와 열정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강의 선택에 앞서 어떻게 하면 덜 노력하고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야비한 셈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요즘 세태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수업이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또한 수업의 질은 좋은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할 때다. 또한 앞으로는 어느 강의에 대한 정보를 모을 때 “그 수업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라고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