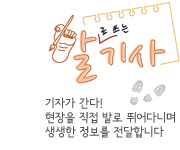
라이더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재밌겠죠? 한 번 타보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등의 말을 익살스럽게 건넨다. 라이더 김형준 씨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인력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끔씩 손님들이 건네는 ‘화이팅!’, ‘힘내세요’ 등의 말을 들으면 정말로 힘이 나요”라며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인력거는 로맨스 코스, 역사 코스, 프리 코스 등 세 가지 코스를 달린다. 인력거가 달리는 종로와 북촌은 과거의 향수가 진하게 묻어있는 곳이다. 달리는 중간 중간 라이더가 승객에게 말을 건넨다. 역사적 공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라이더는 승객과 소통하며 최대한 친해지려 노력한다.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다 인력거를 타게 됐다는 이지현 씨는 “자동차를 탔을 때는 자동차의 속도 때문에 창 밖 풍경을 여유롭게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인력거는 빠르게 지나갔던 주변 풍경들을 눈으로 하나하나 담을 수 있어서 좋고, 마음까지 여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라며 “인력거는 땀을 흘리며 순수한 ‘노동’을 추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쓰는 일, 계산하는 일, 문서화된 현대의 ‘일’과 달리 인력거에서는 일, 노동 그 자체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인력거를 찾은 이영미 씨는 “인력거는 구세대와 현재를 살고 있는 신세대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줘요”라며 인력거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김형준 씨는 “많은 사람들이 인력거를 찾는 이유는 자기 생활 패턴에서 느림을 찾고자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는 빠름을 추구한다. 모든 방면에서 빠름을 추구하고 인간관계 역시 빠르게 식어간다. 심지어 광고에서 조차 ‘빠름빠름빠름’을 외치고 있다. 그야말로 ‘빠름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그 빠름 속에서 얻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 맑게 갠 하늘,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깊은 정, 그리고 따뜻한 소통까지. 어쩌면 인력거의 부활은 인생을 빠르게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조금은 여유롭게 살라는 충고를 던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글·사진_ 정수환 기자 iialal91@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