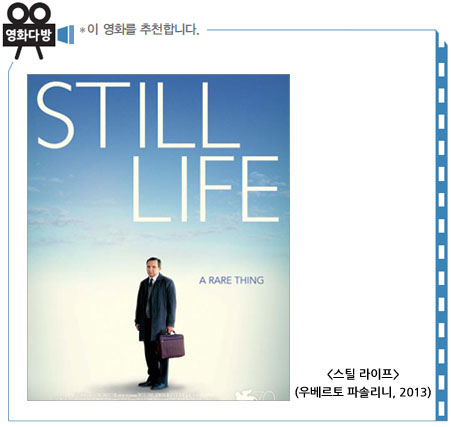
영화 <스틸 라이프>는 제목이 담고 있는 것처럼 사진 한 장으로 기억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 존 메이는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고독사’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그는 현장을 찾아가 시체를 수습하고 고인이 남긴 유품을 정리한다. 지인들을 초대해보지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장례식에는 존 메이만이 쓸쓸하게 자리를 지킨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그는 고인의 유품 중 사진 한 장을 골라 앨범에 붙인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또 슬퍼하지 않을 이 죽음에 대한 존 메이만의 추모 방법이다.
혹자는 장례식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한데 모여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치러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장례식은 철저하게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는 쓸쓸한 장례식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기억하려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장례식은 ‘고인이 세상과 이별하는 의식’으로서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누군가에게는 장례식이 마음의 가책을 덜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인에게 장례식은 세상에 본인의 흔적을 남기는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차가운 묘비, 앨범에 자리한 사진이나 유품처럼 정물(still life)이 증명하는 삶은 여전히 쓸쓸하다. 그렇기에 존 메이는 자신의 기억 속으로 고인들을 끌어 들인다. 그런 점에서 존 메이는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뒤늦게나마 달래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항상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한 탓일까, 혹은 이미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온 탓일까. 존 메이의 장례식장 역시 텅 비어있다. 고독사를 처리하는 공무원 ‘존 메이’ 조차도 없는 장례식장은 영화에 등장했던 그 어떤 장례식보다도 슬프게 다가온다. 결국 기억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그의 죽음 역시 쓸쓸한 묘비 하나로 남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 잊혀져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도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글을 써서, 사진을 찍어서 그 흔적을 남기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에 자리함으로써 죽은 뒤에도 그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존 메이의 장례식에서 당신은 누군가의 그리움들로 점철되는 삶의 찬란함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함께 보면 좋은 영화
- <싱글맨> (톰 포드, 2008)
- <엔딩 노트> (마미 스나나, 2011)
장한빛 기자 hanbitive@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