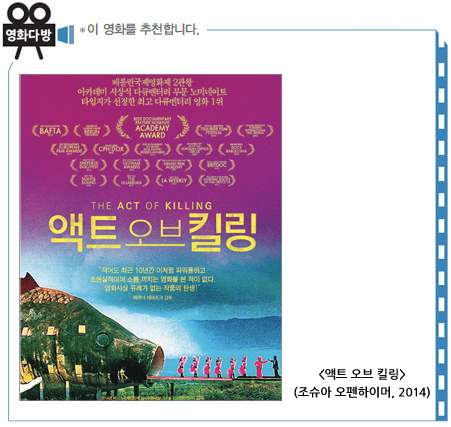
1965년 인도네시아 군부정권은 공산주의 척결을 내세우며 노동조합, 중국인, 소작농 등을 무자비하게 살해한다. 군부정권은 깡패들까지 동원해 학살을 자행한다. 단 1년 만에 1만 명의 시민들이 학살당했다. 이후 2014년에 인도네시아는 처음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학살의 주도세력들은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주인공 ‘안와르 콩고’ 역시 1960년대의 군부정권이 학살을 위해 동원한 깡패였다. 넉살 좋고 유복한 노인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그는 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영화 초반 그는 과거에 사람들을 살해했던 현장에 카메라를 가져가 환히 웃으며 ‘피가 너무 많이 튀어, 철사로 목을 조르는 방법을 개발했다’며 시범을 보인다. 그는 그의 ‘영웅담’을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다. <액트 오브 킬링>은 안와르 콩고가 자신의 영웅담을 영화로 제작하는 과정을 그린다.
안와르 콩고의 영화 제작은 ‘판차실라 청년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력을 받는다. 학살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판차실라 청년단은 300만 명이 넘는 거대조직으로 성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들을 지원하고, 응원한다.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조직폭력배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곳에 민주주의는 없다. 벌을 받아야 할 가해자가 오히려 행복한 세상이다.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은 그 어떤 다큐멘터리도 시도하지 못했던 독특한 접근을 시도한다. 안와르 콩고는 어떻게 사람들을 살해했는지 재현하는 한편 역할을 바꿔 자신이 직접 살해당한 사람들을 연기해보기도 한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연기한다는 이 충격적인 접근은 관객들에게 두 번 다시없을 경험을 제공한다. 마치 심리치료에서 서로의 역할을 뒤바꿔 연극을 해보는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것만 같다. 영화를 찍으며 안와르 콩고는 잘못을 서서히 자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변명을 덧붙인다. ‘어쩔 수 없었다고.’ 영화 말미 그는 사람들을 학살했던 현장에서 끊임없이 토악질을 한다. 그 기묘한 모습이 관객들을 무겁게 짓누른다.
영화에서 판차실라 청년단 대표는 “민주주의가 대체 뭡니까. 군사독재 시절이 좋았어요. 경제도 성장했고 치안도 튼튼했죠”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어딘가 기시감이 들어 머리를 세게 쥐어박히는 것만 같다. 민주주의가 대체 뭘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미화되고 감춰지고 있을지 모를 폭력과 학살의 역사에 대해 민주주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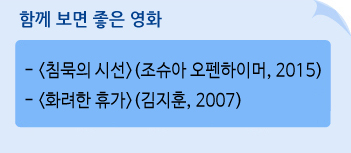
김태현 기자 taehyeon119@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