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뉴로맨스>에 참여한 작가들은 인공합성생물, 하이브리드 개체 혹은 가상에서 존재하는 데이터와 같은 미지의 생명체의 모습을 설치미술로 표현했다.
작품들을 처음 본 순간, 당신은 당혹스러울지도 모른다. 미지의 생명체가 우리 곁에 있는 상황이 매우 이질적이라 불편하기 때문이다. 작가 패트리샤 피치치니는 영상, 페인팅, 조각 등을 통해서 괴물의 모습을 묘사한다. 작품 속 괴물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지만 전시를 둘러보다보면 낯선 생명체들이 가진 속성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낯선 생명체들은 인간만의 산물이라고 여겨졌던 언어, 예술이라는 문명까지도 갖고 있다. <부르주와 로봇의 신중한 매력2>이라는 작품에서 부르주와 로봇은 사치스러워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고 전시관을 돌아다닌다. 관람객이 다가가면 재빨리 다가와 관람객 주위를 돌며 탐색전을 벌인다. 이 때 로봇의 남에게 간섭하고 싶어 하는 오지랖 넓은 성격이 드러난다. 지겨워진 로봇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거울 앞을 서성이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본다. 자기애에 푹 빠진 이 로봇은 인간과 같이 하나의 ‘성격’을 가진 셈이다.

<뉴로맨스>의 작품들은 자발성을 갖고 있다. 작품이 시시각각 움직이거나 눈 깜짝 할 사이에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작품들이 단순히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우연적인 확률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도록 고안됐기 때문이다. 무작위의 변수를 반영하는 기계는 마치 자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관객과 자본적인 소통을 하게 한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태어난 낯선 생명체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간다. 우리는 전시 공간에서 비인간적 존재들을 관찰하는 동시에 압박받고 인간성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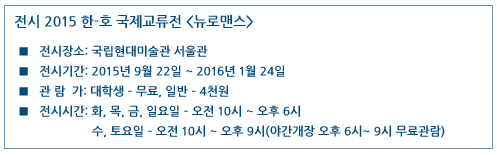
글·사진_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