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고 기사를 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기자 ‘댄’은 우연히 자동차에 치인 ‘앨리스’를 발견하고 보호자를 자처한다. 스트립 댄서인 앨리스는 댄에게 자신의 직업과 기구한 인생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한다. 이윽고 댄은 앨리스의 솔직함에 끌리고 동거로 이어진다. 댄은 앨리스의 인생을 소재로 소설을 써 소설가가 되지만 책 표지를 찍기 위해 만난 사진작가 ‘안나’에게 한눈을 팔게 된다. 여자인 척 신분을 가장하고 익명 인터넷 채팅을 하는 고약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댄은 우연히 피부과 의사 ‘래리’와 채팅을 하게 된다. 댄은 자신의 이름이 안나라며 래리에게 아쿠아리움에서 만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진짜 안나가 약속장소에 나타나게 되고 그 곳에서 가짜 안나(댄)을 기다리던 래리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연극 ‘클로저’에 나오는 인물들은 각각 다른 사랑을 믿고 있다. 댄은 안나와 앨리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한다. 상대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작 자신은 적절한 거짓말을 섞어가며 불리한 상황을 무마하면서도 말이다. 다른 인물이 생각하는 사랑도 각기 다르다. “너와의 섹스가 언제나 즐거웠던 건 아니야. 흥분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맞냐고 추궁하는 댄에게 안나가 고백한다. 안나에게 댄과 래리를 사랑했던 순간들은 일말의 거짓도 없다. 하지만 매순간 사랑에 얽매여있는 것은 안나가 믿는 사랑이 아니다.
‘진실한 사랑’ 사랑에 진실을 바랄 수 있을까. 사랑은 불변할 것처럼 보이며, 불변하다고 믿고 싶지만 정작 사랑에는 정해진 모양도, 색도 없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사랑의 형태를 만들고 색을 칠한다. 그렇게 완성된 사랑을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상대방에게 강요한다. 포장된 진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 우리는 절망에 휩싸인다. 그것이 애초에 허상이어도 말이다. 사랑은 잔인하다.
“사랑이 어디 있는데?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 들을 수도 없다고!” 진실을 요구하는 댄에게 외치는 앨리스의 마지막 대사다. 경험을 할수록 사랑의 실체는 우리의 심장을 난도질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조금씩 타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사랑에는 진실이 필요하지 않다. 조금씩 타협하고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연극 ‘클로저’는 막이 내린 뒤에야 내 가슴에 속삭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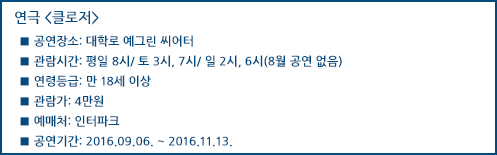
국승인 기자 qkznlqjffp44@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