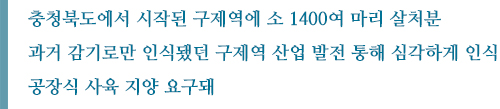
구제역은 150여 년 전 세계 도처에서 본격적으로 발견됐으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1839년 8월, 영국 이즐링턴의 한 대규모 목장주는 자신의 젖소 중 6마리가 다리를 절며 침을 흘리는 것을 발견했다. 입과 발굽에 물집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상은 곧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몸무게가 줄었고, 젖소의 경우 젖통에 염증이 생겨 젖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목장주들은 태연했다. 감염된 가축은 곧 회복돼 치사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농부들은 남은 곡식을 먹이거나 분뇨를 거름으로 쓰기 위해 소를 키워 이익에도 덜 민감했다. 구제역은 감기와 같이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구제역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1865년에 발생한 ‘우역’은 치사율이 높아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했다. 이때부터 가축질병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구제역의 증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시대 상황이 변했다. 영국은 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아 영국의 농업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농부들은 점차 이익에 민감해졌다. 구제역은 더 이상 ‘가벼운 감기’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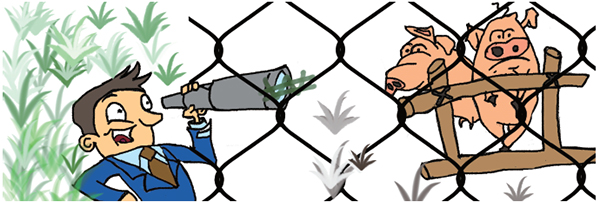
경제주의가 병을 키웠다
산업이 병을 만들었고 산업의 확장이 병을 키운 셈이다. 이는 구제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이러스 대습격』의 저자 앤드루 니키포룩은 가축질병 피해 확대의 두 축으로 무역과 공장식 축산업을 꼽았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콜레라 등의 가축질병은 높은 전염성을 특징으로 한다. 좁은 공간에 과도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업과, 늘어나는 세계 무역은 가축 질병의 전염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공장식 축산업은 동물들의 면역력을 떨어트린다. 생산량 극대화를 위해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단일 종만을 키워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계기구는 무역 증진을 위해 규제를 도외시했다. 이것은 구제역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동물보건청 청장을 지냈던 바츨라프 코우바는 전세계 가축의 건강을 담당해야 할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동물 전염병 억제보다 세계 무역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꼬집었다. 1990년대 중반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동물 전염병 발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 수입을 통한 질병의 전염을 다루던 정기 보고서도 폐간했다.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김 연구원은 “육식은 다국적 기업의 이해와 얽혀있다. 공장식 축산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한 값싼 사료를 이용한다”며 “여러 연결고리 가운데 구제역이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숫자로 동물을 이해했다. 구제역에 대한 대응에서도 이는 두드러진다. 2001년 영국에 구제역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영국 내각 상황실은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을 24시간 내에 도살하고 감염지역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발굽 있는 동물을 48시간 안에 없애기로 결정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산 결과였다. 2001년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2026마리였지만 예방을 위해 천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살처분 당했다.
각국 정부의 구제역 대응은 변하고 있다. 20세기까지는 예방적 살처분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점차 백신의 활용을 늘리는 추세다. 한국은 2010년과 2011년 당시 구제역이 발병했을 때 예방적 살처분의 명목으로 345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했다. 하지만 당시 구제역으로 죽은 가축이 없어 정부는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후 백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구제역을 근절하기란 불가능하다. 2001년 영국의 구제역 참사 이후 구성된 왕립 학회와 유럽 의회 조사단은 수입제한 조치를 통해서는 바이러스 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구제역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구제역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제역을 근절의 대상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처방할지에 주목하기보다 구제역과의 공존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구제역을 산업적 질병으로 프레이밍 했던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김 연구원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을 위해서라도 경제주의적 시각에서만 동물을 바라보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공장식 사육이 질병을 초래해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목광수 교수는 “공장식 사육은 자살골과 같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동물들과 공생관계로 가야 한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_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삽화_ 김도윤 기자 ehdbs7822@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