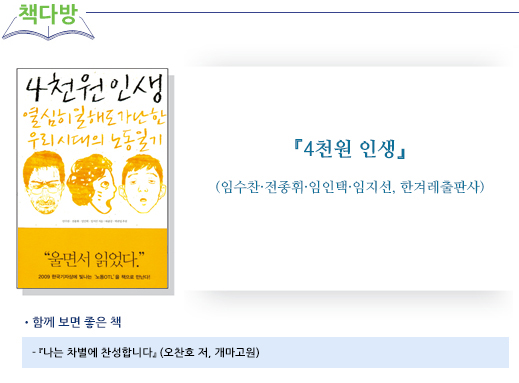
약 10년 전, 한겨레의 네 기자가 이들의 삶을 알아보고자 했다. 한 달 동안 ‘식당 아주머니’로, 마트 판매원으로, 가구와 난로 공장으로 취업한 기자들은, 각종 통계의 한 숫자에 불과했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했던 삶의 존재를 새삼 깨닫는다. 나름 사회부 기자였던 기자들은 ‘그들이 평소 잘 안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직접 되어봤던 생생한 경험담과 후기를 책으로 남겼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자조하는 기자들의 회고는 독자의 마음을 후벼파면서도 계속해서 책장을 넘기게 만든다. 한 식당의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고기 뼈다귀 하나 먹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애완견에게 보란 듯이 간식으로 준다. 마트 판매원은 바글바글한 마트 속, 아무도 눈 마주쳐주지 않는 동상에 불과하다. 공장 인부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이에게, 서로에게만 으르렁댄다.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아 보인다.
기자들은, 신문면을 장식하는 정치,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판타지’와 다름없다고 말한다. 잠시나마 한 기자의 직장동료였던 이는 서른이 넘었음에도 군대 이후로 투표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들의 삶이 너무 급박하고 그들을 눈여겨보는 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이는 “언젠가 한달에 더도 말고 200만원만 버는 것이 소원”이라며 “자신은 지금 너무 게으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비가 아까워 대학마저 그만두고 매일같이 12시간을 일하는 그는 ‘너무’ 부지런하다. 이들은 과연 얼마나 길들여졌던 걸까. 너무나 힘겨운 삶은 역설적이게도 그 삶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데 급급하게 만들고 주위에서는 “원래 그런거야”라고만 말할 뿐이다. 피라미드 아래의 사람들은 아슬아슬한 벼랑길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밖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모든 부조리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우리마저 이들의 문제를 이들의 탓으로 돌릴 순 없다. 늪에 빠져 발버둥치는 이에게 왜 늪에 빠졌느냐, 왜 빠져나오질 못하느냐고 묻는 것은 의미 없다. 한편, 이 길들여짐은 아직 직장인이 되지도 못한 한 대학생으로서도 느낄 수 있기에 더욱 마음 아프다. 이따금씩 대학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부조리’, 세계적으로 시끌시끌한 ‘여성억압’ 등은 결코 같은 종류의 길들여짐과 무관하지 않다.
기자들의 취재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현재에도 노동문제와 주체 모를 길들임이 도처에 널려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책 속의 이야기는 오늘날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세상이 알아서 굴러가게 놔둬야하는 걸까. 이에 한 기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무엇인가 바뀌어야한다고 느끼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한다. 어느 때든 항상 희망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은 이 책이 보여주는 사회의 슬픈 모습 속에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길들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