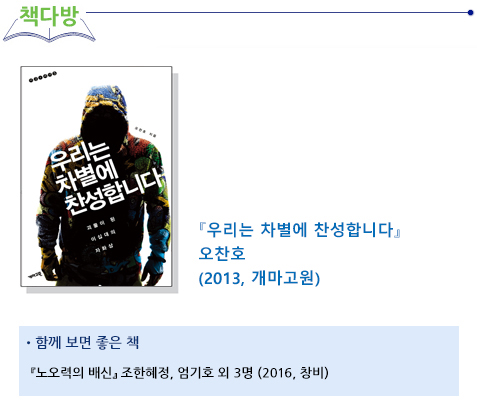
그래서 수능 성적표는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얼마 후, 새내기 배움터에 가보니 정시, 내신 전형, 학생부종합으로 합격해 들어온 학생들이 뒤섞여 있었다.
대학 입시가 삶에 전부였던 아이들답게, 대화 주제는 주로 ‘무슨 전형으로 들어왔나’로 흘렀다. “나는 Y대학교 낮은 과에도 합격했는데 여기 왔다”, “나는 H대학교이긴 하지만 여기보다 입결 낮은 곳도 합격했었다” 등등.
그리고 수시 전형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애중에 수능 4등급대인 경우도 있대” 하는 식이었다. 새내기 배움터 이후로도 동기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하는 날이면 비슷한 대화 주제로 흘러가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2013)의 저자 오찬호는 이를 이렇게 분석한다. 수능 점수를 통한 대학의 입결은 ‘진리의 빛’이 돼버렸고, 대학생들 스스로도 여기서 발생하는 차별을 인정한다.
그래서 “수능을 못봐서 여기 왔다”나 “낮은 과였으면 K대도 갈 수 있었다”는 말은 ‘시립대 ○○학과’라는 수준이 그대로 이해되기 전에 ‘나는 ○○학과 수준이 아니다. 그 정도의 실력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호소이자, ‘대학서열’이라는 원칙하에 낮은 서열의 대학생들을 쉽게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그 줄에서 살짝 벗어나고 싶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시립대 안에서 다시 입결이 높은 학과와 낮은 학과로 나뉜다. 학과 안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다. 같은 학과 학생 안에도 정시, 수시, 편입의 수준이 다시 나뉜다. 작가는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내부를 쪼개고 줄세워 1등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 체계 구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등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사회 구조가 그 엄청난 불공정성에도 어떻게든 유지되는 것은 이처럼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이 구조를 적극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작가는 현재 20대가 가진 동류의식으로 ‘타인의 상승에 대한 거부감’을 제시한다. 작가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경쟁에서 도태될 확률은 높아졌고, 따라서 “수능 점수라는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람을 미리 재단하는 건 타인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너무나도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작가의 말은 뼈아프다. 나 역시 가해자가 되기 위해 피해자 되기를 기꺼이 감수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작가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죽도록 노력해야 성공한다’는 공식을 배워온 20대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고 고민을 멈출 일은 아니다. 작가는 ‘대안이 있냐’는 질문이 문제제기 자체를 가로막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연대할 기회를 앗아간다고 답변한다.
임하은 기자 hani1532@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