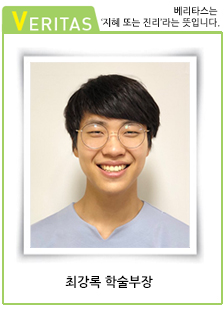
수학에서는 새로 발견한 공식이 기존의 공식과 모순만 없으면 그 공식은 진리가 된다. 무리수를 발견한 한 학자는 피타고라스에 의해 죽었다. 세상은 자연수로 이뤄졌다고 말한 피타고라스의 머릿속에서는 ‘무한한 소수점을 가진 수’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는 논박하는 대신 그 공식을 만들어 낸 사람을 죽였다. 천하의 피타고라스도 증명된 공식을 논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그 스스로 견고한 탑을 세웠다. 결코 논박할 수 없는, 경외심마저 드는 수학이라는 탑 말이다.
하지만 물리학은 다르다. 물리학은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 몇백 년 동안 인정받아온 공식도 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200년 동안 진리로 여겨지던 뉴턴의 역학도 ‘빛이 휘어진다’는 사실 앞에서는 더 이상 진리일 수 없었다. 현실을 담는다는 것은 언제든 비판과 반박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순간에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논파 될 수 없는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현실과 관련이 없다면 독자들은 분명히 의문을 가질 것이다. “나는 왜 이런 글을 읽어야 하지?” 과연 칸트의 ‘논리 철학 논고’를 요약해 글을 쓴다면 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글은 모순은 없을지언정, 독자들의 비판은 받지 않을지언정 독자들에게 읽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사는 물리학을 닮아야 한다. 현실을 담아내야 한다. 현실에 맞아야 한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뉴턴의 역학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수하고 기사는 현실을 담아내야 한다. 독자들의 현실을 파고들어 문제를 발견해 내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며, 현실을 다루는 것. 세상을 향한 창을 내는 신문 기자의 숙명이다.
최강록 학술부장
rkdfhr1234@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