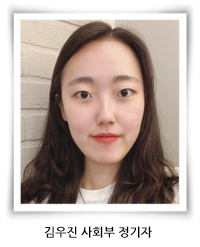
1월에 신문사에 들어와 기자로 활동한 지도 5개월이 넘었다. 처음 수습기자라는 명칭을 달고 우리대학 부서에 전화했을 땐 인터뷰 요청을 과연 받아줄까라는 걱정이 앞섰다. 대학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요청보다는 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예상외로 우리대학 담당자분들은 흔쾌히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였다. 긴 시간이 드는 취재도 마다하지 않았다. 난관은 따로 있었다. 학교 밖 관계자들에게 취재 요청을 해야 할 때였다. 그땐 직업 기자가 아니라는 자격지심이 더 커졌다. ‘바쁜 사람들인데 인터뷰 요청에 응해줄까’라는 생각에 선뜻 요청을 하기 어려웠다. 기사를 위해 자격지심을 뒤로하고 전화를 했을 땐 긍정적인 반응에 놀랐다. 서울시청 관계자도 공기업 인사채용 담당자도 서울혁신파크 인근 주민도 흔쾌히 취재에 협조해줬다. 수요시위 취재를 갔을 땐 경찰로부터 대학 신문 기자라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프레스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만 좁은 생각에 갇혀있었다.
인터뷰와 취재 요청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직업 기자라는 것은 없다. 누구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을 수 있고 파고들 수 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모두의 권리고 진실을 파헤칠 권리도 모두의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글을 쓰는가가 어떤 기자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다.
기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직업이다. 기자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대상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뤄진다. 짧은 기간 얻은 미흡한 결론이지만 질문하는 것의 소중함과 답변이 오는 것의 고마움을 알게 한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을 안고 취재에 임할 때 파고들고자 하는 대상과 해야 하는 질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김우진 기자 woojin2516@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