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할 때, 실연을 당했을 때, 인생에서 큰 고비를 만났을 때 감정을 어루만져 주고 마음을 대변해 주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입니다. 학창시절 문학 시간에 가장 많이 만나는 시는 우리가 느껴왔던 감정을 문장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느껴 보지 못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일명 사랑시는 더욱 절절해 가슴에 오래 남곤 하는데요. 시 중에는 이렇게 정서를 어루만지는 서정시도 있지만 이상의 「오감도」와 같은 난해시, 해체시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는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독자에게 주죠. 그런데 우리가 정서적 감흥을 얻는 서정시에서도 감정, 정서뿐만 아니라 시인의 철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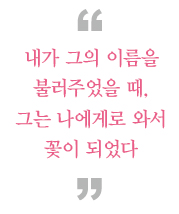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도입으로 시작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은 읽고 나면 사랑에 갓 빠진 연인이 떠오릅니다. 특히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문장에선 그 감정이 증폭되죠. 누구나 꽃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에게, 너에게 특히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말은 큰 감흥을 줍니다. 그래서 「꽃」을 처음 읽으면 연애시, 사랑시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엔 김춘수 시인의 존재론적 사유가 숨어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시의 문장이 새롭게 읽힙니다.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는 하이데거를 뺄 수 없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자와 존재의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자면 주체와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대상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현대문명이 도래하면서 우리는 이 대상이 희미해지는 순간을 자주 겪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만 치부되고 대상에 대한 깊은 사유보다는 대상을 사물로 정의내리기 바쁘죠. 하이데거는 존재론을 통해 이것을 경계합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착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언어라고 말합니다. 언어를 통해 대상을 보고 느끼고, 존재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론적 사유가 「꽃」의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시의 시작에서부터 바로 드러납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을 포착하기 전에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 후에는 대상이 인식되고 그 대상이 ‘꽃’으로 명명됩니다. 이 ‘이름’이라는 표현도 존재론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언어라는 통로에 이름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꽃을 ‘꽃’이라 부르고 나무를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꽃은 처음부터 ‘꽃’이었을까요?
꽃은 대상 자체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포착하고 명명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시인은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을 통해 꽃을 보고 말을 겁니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어떤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그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며 존재자인 인간 또한 또 다른 존재자에게 존재로서 포착되고 명명되길 소망합니다. 존재로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망각됩니다. 우리 곁의 수많은 이름 없는 것들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그러곤 자신도 ‘꽃’이 되고 싶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며 인식되고 싶은 존재 정의를 이야기하며 시는 끝이 납니다.
존재론에서의 존재는 존재자의 포착을 통해 정의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이 포착되기 전에도 존재한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상의 본질에 대한 탐구도 시작됩니다. 존재자가 정의한 존재가 대상의 본질인지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들은 대상과 자아를 합일시켜 서정성을 발휘하고 대상을 존재로 끌어내기 위해 은유를 사용합니다. 유사한 무언가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는 온전히 독자의 몫입니다.
「꽃」은 대상이 그저 있는 상태에서부터 존재자가 존재로 보고, 유사성으로 표현하는 단계까지를 서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비단 「꽃」뿐만 아니라 은유가 사용되는 모든 시에서 시인이자 존재자가 존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음미합니다. 그리고 시를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든 순간에도 존재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대상과 부딪치고 만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릴 적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나야?” 그 질문의 답을 여러 존재자들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를 꽃으로, 나도 그들을 꽃으로 정의 내려준다면 더욱 낭만적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김우진 기자 woojin2516@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