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check
| ‘유기 식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아마 유기 동물은 들어봤어도 유기 식물은 어감부터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기는 ‘공덕동 식물유치원’입니다』는 버려진 식물들을 구조하는 프로젝트를 담았다. 백수혜 씨가 운영하는 ‘식물 유치원’은 유기 식물들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한다. 식물 구조 과정부터 작은 생명들이 전하는 메시지까지 열리지 않았던 당신의 ‘초록 시야’가 넓혀지기를 고대한다. -편집자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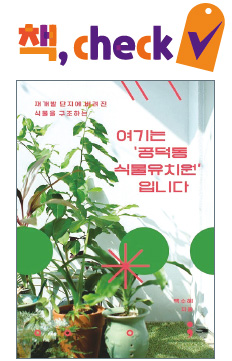
버려진 식물들을 구조한다고?
누구나 한 번쯤 버려진 식물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쓰레기장에 버려지거나, 아파트 화단에 덩그러니 놓여 주인이 있는지 알 수 없는 화분들···. 공덕동 재개발 단지에도 버려진 식물들이 가득했다. “이 식물들은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어디로 가지?” 남겨진 식물들을 의식하자 더 많은 식물이 백수혜 씨의 눈에 들어왔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화분도 있었다. 냄새는 지독했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었다. 그렇게 집은 하나둘씩 데려온 식물들로 가득해졌다. 구조한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해 다른 집으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백 씨의 머리를 스쳤다. 유기 식물 구조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남겨진 식물의 끈질긴 생명력이 그들을 제2의 삶으로 이끌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무렵, 코로나19가 한창이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식물에 대한 관심이 치솟았다. 구조한 식물을 키울 사람을 찾아 백 씨는 식물 마니아가 포진한 SNS ‘트위터’에 가입했다. 가입한 계정에 ‘공덕동 식물유치원’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유치원에 입학한 원생들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때까지 돌봄을 받는다. 푸릇푸릇한 잎을 띠며 상태가 좋아지면 졸업할 차례가 된다. SNS에 분양 소식을 올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준다.
그렇게 유치원을 떠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초록 손’을 가진 사람에게 가는 식물들은 놀랍도록 건강해지기도 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식물들에게 백 씨는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었다.
식물과 공존하는 삶
유기 식물들을 구조한다고 해서 식물에 대해 박식한 건 아니었다. 백수혜 씨는 장미나 튤립같이 기본적인 아이들과 벚나무, 단풍나무 등 각 계절에 두드러지게 피는 친구들만 알았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길가에 있는 아이들을 구조하다 보니 그 생각은 금방 깨졌다. 식물의 생김새가 너무 다양했고 같은 식물이더라도 학명, 화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그러던 중 백 씨는 ‘모야모’ 어플을 알게 됐다. 식물 사진을 찍어 올리면, AI가 아닌 식물에 박식한 사람들이 댓글로 이름을 남겨줬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하나둘씩 대체하는 세상이지만 아직도 인간의 섬세한 영역까지는 닿지 못한 듯하다. 식물의 이름을 척척 달아주시는 분들을 보며 백 씨도 언젠가 식물 박사가 될 모습을 꿈꿨다. 트위터를 통한 식집사들과의 교류부터 식물 고수들이 전해주는 정보들까지. 무계획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수많은 사람의 애정과 친절함 속에서 지속될 수 있었다.
유기 식물 구조 프로젝트를 통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기자의 눈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길거리를 걷다 마주친 버려진 식물들의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식물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선뜻 구조에 나서기에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백 씨가 낸 용기에 수많은 식물이 소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구조된 식물은 화원에서 파는 것처럼 잎이 생글생글하거나 모양새가 정교하게 다듬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구조된 서사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기에 충분했다. ‘더불어 사는 삶’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식물과 공존하는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백 씨의 프로젝트는 죽어가는 식물들을 살려 인간과의 상생을 돕는다. 유기된 식물들이 없어질 때까지 식물 유치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유진 기자
uzzin0813@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