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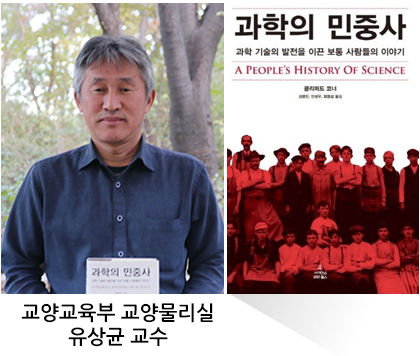
21세기를 맞이한 인류는 온통 기술문명에 파묻혀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기술의 많은 부분은 현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인류는 과학자들이 탐구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나 방법이 일반 민중들이 접근하기에 너무나 전문화돼있고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현대 과학이 철저히 민중들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인류가 처음 과학과 철학을 시작한 시기는 BC 6세기 경, 철학자 야스퍼스가 명명한 ‘축의 시대(axial age)’라 할 수 있다.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 인도, 그리고 그리스에서 현인들이 등장해 인간 사고의 축이 세워졌다. 특히 그리스는 세계의 본질(arche)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신화적 세계관에서 인간 이성에 기반을 둔 로고스적 세계관으로 전환함으로써 과학적 사고가 탄생했다.
이후로 긴 시간을 지나 갑자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데카르트, 뉴턴과 같은 위대한 천재들이 수학을 기초로 한 과학적 체계를 세움으로써 근대 과학을 탄생시켰고, 이후 발전을 거듭해 20세기에는 일반 민중들은 얼씬도 못하는 난해한 과학이 됐다. 물론 과학은 기술문명 말고도 우리 세계의 기원이나 진화, 광활한 우주와 물질의 기초에 대해 근원적으로 알 수 있게 했으며 이는 과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지식인들의 사고를 넓혀줬다. 또한 많은 이들은 이 찬란한 지식 체계에 대해 경이로움을 가지고 위대한 천재들을 아낌없이 칭송한다.
그런데 과학이 천재들만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을까? 그리스의 자연철학자들은 갑자기 나타나 과학을 시작했으며 17세기와 20세기 과학혁명의 주인공들 역시 처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혁명의 주인공이 됐을까? 세상에는 많은 과학사 책이 있지만 대부분이 위대한 천재들의 업적과 삶을 이야기하고만 있다.
그러나 필자가 소개하려고 하는 클리포드 코너의 『과학의 민중사』는 제목처럼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끈 보통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인 코너는 매우 독특한 이력을 지닌 학자다. 미국 조지아 공대를 졸업하고 군수업체인 록히드 항공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 과학의 군사적 속성을 깨닫고 퇴직한 후에 오랜 세월 반전운동, 노조운동을 벌였다. 40대에 대학원에 입학했고 과학사를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여타의 과학사 책과 달리 과학의 역사에서 이름도 모르는 다수의 민중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과학에 더 많은 기여를 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코너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뉴턴의 능력은 자신의 주장처럼 ‘거인들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던 덕분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글자도 모르는 다수의 장인들과 그 외의 사람들의 등위에 서 있었던 덕분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과 더불어 뉴턴의 과학혁명을 뒷받침한 16세기 보통 사람들의 역사를 소개한 일본의 과학자 야마모토 요시타카의 『16세기 문화혁명』도 소개하고 싶다.
『과학의 민중사』는 그 리스트가 30쪽이 넘는 많은 자료들을 근거로 선사시대의 수렵-채집인들이 생존을 위해 가지게 됐던 과학적 지식이 이후 의학에 기여한 것으로부터 그리스 과학의 기초를 제공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장인들, 17세기 과학혁명에 기여한 대양 항해자들과 16세기 여러 분야의 민중들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구슬을 꿰어내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란 점에서 과학자들은 충분히 칭송받을 만하지만 그 구슬 하나하나를 제공한 민중들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초래한 심각한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가 생태계를 복원함에 있어서 극도로 전문화된 과학의 ‘형식지’와 오랜 전통과 체화된 지식을 갖춘 민중들의 ‘암묵지’를 결합해야 할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책이다.
제목| 과학의 민중사
저자| 클리포드 코너
출판| 사이언스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