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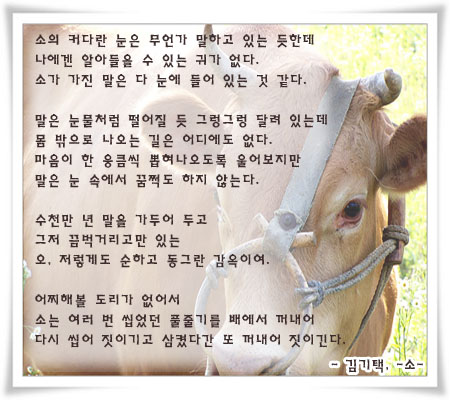 |
한밤중에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수화기를 든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필경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수화기 너머의 그 말없는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줄곧 듣고만 있었습니다. |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