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詩)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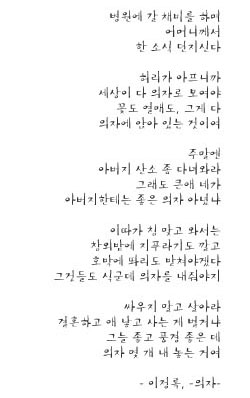 |
회사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야유회를 가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있으려니 직원들의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직원들의 의자에 번갈아가며 앉아 보았습니다. |
김점용/시인, 객원교수
webmaster@uo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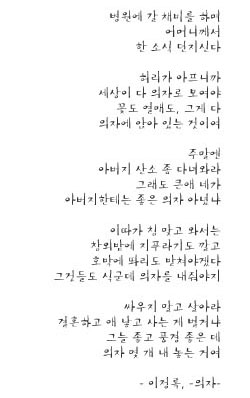 |
회사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야유회를 가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있으려니 직원들의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직원들의 의자에 번갈아가며 앉아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