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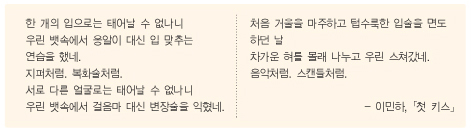 |
오늘날 우리의 시에서 병리적 징후는 뚜렷하다. 예술의 가장 보편적인 주제가 ‘고통’이라는 지적이 이미 있다. 그래서 이민하의 시에서 종종 발견되는 어떤 병리적 징후들, 예컨대 ‘거식증’ ‘소화불량’ 따위의 시어들도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문제적인 것은, 병리적 진단을 통해 새로운 미학적 개념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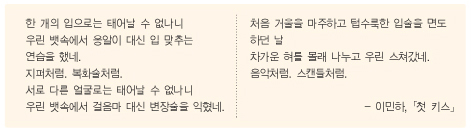 |
오늘날 우리의 시에서 병리적 징후는 뚜렷하다. 예술의 가장 보편적인 주제가 ‘고통’이라는 지적이 이미 있다. 그래서 이민하의 시에서 종종 발견되는 어떤 병리적 징후들, 예컨대 ‘거식증’ ‘소화불량’ 따위의 시어들도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문제적인 것은, 병리적 진단을 통해 새로운 미학적 개념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