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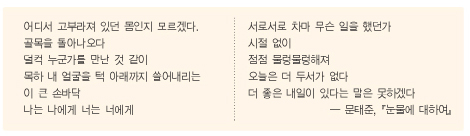 |
○○씨에게. 시 한 편을 마주하고, 문득 당신을 떠올린 건 무슨 이유였을까요. 아마도 당신의 커다란 눈 때문일 겁니다. 시인이 “덜컥” 눈물을 대하듯, 당신의 눈에선 이따금 슬픔이 비치곤 합니다. 그 슬픔은 당신의 입가에 머무는 미소와는 무관한 듯 보이기도 하지요. |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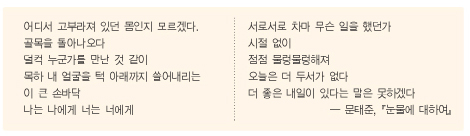 |
○○씨에게. 시 한 편을 마주하고, 문득 당신을 떠올린 건 무슨 이유였을까요. 아마도 당신의 커다란 눈 때문일 겁니다. 시인이 “덜컥” 눈물을 대하듯, 당신의 눈에선 이따금 슬픔이 비치곤 합니다. 그 슬픔은 당신의 입가에 머무는 미소와는 무관한 듯 보이기도 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