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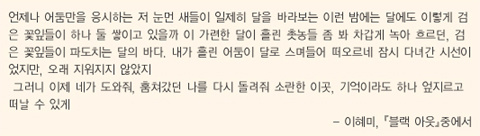 |
칠흑 같은 밤, 달이 떠올라있다. 그러나 그뿐이다. 어둠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달빛 한 줄기가 세상을 환히 밝혀줄 거라는 미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 어둠을 빚어낸 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이기 때문이다. |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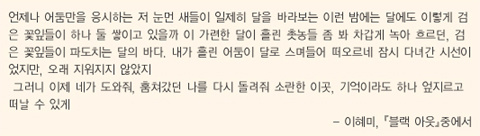 |
칠흑 같은 밤, 달이 떠올라있다. 그러나 그뿐이다. 어둠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달빛 한 줄기가 세상을 환히 밝혀줄 거라는 미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 어둠을 빚어낸 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