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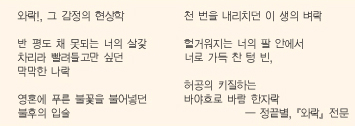 |
요한복음의 첫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구절은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도 되새겨볼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있음’과 ‘믿음’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은 정말 있는 것일까? |
서울시립대신문
webmaster@uo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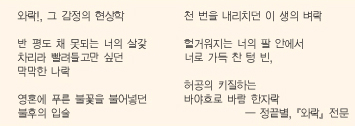 |
요한복음의 첫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구절은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도 되새겨볼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있음’과 ‘믿음’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은 정말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