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 읽어주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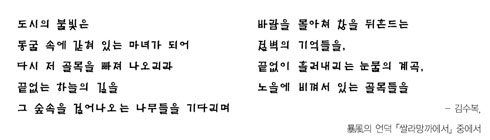 |
언젠가 “도시란 뭘까”라는 질문에 무심코 “욕망의 쟁투”라 답했다. 아마도 소비문화를 두고 한 얘기였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조금 뜻밖의 대답을 했노라 하는 자책이 없지 않지 않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의 시야에 들어오는 도시는 어딘가 슬픈 구석이 없지 않았다. |
박성필(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
webmaster@uo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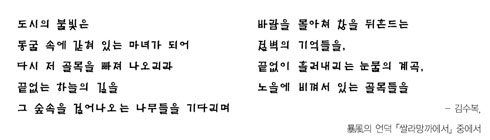 |
언젠가 “도시란 뭘까”라는 질문에 무심코 “욕망의 쟁투”라 답했다. 아마도 소비문화를 두고 한 얘기였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조금 뜻밖의 대답을 했노라 하는 자책이 없지 않지 않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의 시야에 들어오는 도시는 어딘가 슬픈 구석이 없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