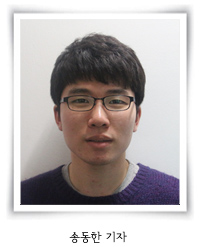
기사의 방향을 잡기 위해 다른 기자들과 많은 논의를 했다. 선배기자들을 붙잡고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질문했다. 모든 선배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질문했던 것 같다. 또 수시로 구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전화로 물어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선배기자들은 다소 성가셨겠지만 그런 내색 없이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논의를 해줬다. 동료기자들과도 많은 논의를 했다.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회의 시간은 물론이고 잡담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까지도 기사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오게 됐다. 헤매던 것에 비해 기사는 ‘구성이 괜찮다’는 평을 들어 기분이 좋았다. 내가 전적으로 구성을 한 것도 아닌데 내 기사가 칭찬을 들으니 민망하다. 이번 신문에서 숙달되게 기사를 쓰지는 못했지만, 기사를 위해 참 많이 고민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열심히 기사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은 동료와 선배기자들이 열심히 기사작성에 임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한 동료기자의 경우 선배기자가 이만하면 충분한 기사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다며 끝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의도는 앞으로도 고민을 느슨히 하지 않겠다는 나자신의 다짐이자 독자와의 약속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선배와 동료기자들을 질문으로 괴롭혀야 할 것 같다.
송동한 기자 sdh1324@uos.ac.kr
송동한 기자
sdh1324@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