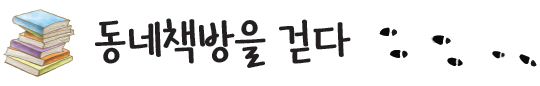
가까이에 있는 아름답고 무용한 동네책방, ‘아무책방’
우리대학 정문에서 가까운 위치에 동네책방이 있다. 이름은 ‘아무책방’이다. 아름답고 무용한 책방이라는 뜻이다. 특이한 이름의 이 동네책방은 지난 7월 30일에 처음 문을 열었다. 문학과 인문 서적을 주로 다루며 독립출판물도 판매하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임에도 좌우에 배치돼 있는 책장에 책이 가득 꽂혀있었고 가운데 책상에는 독립출판물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다. 서가를 살펴보니 문학의 비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문 서적이다. 독립출판물의 비중은 비교적 적었지만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아무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원주신 씨는 이전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퇴근 후에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러다 문득 서점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제집을 파는 서점에서 1년간 일했다. 동네 서점에서 일하는 중에 망원이랑 해방촌 등 여러 곳에서 동네책방이 생기자 자신도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막무가내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쪽에 수완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경영을 잘한다거나 셈에 밝은 사람이 아닌데 용감하게 별 생각 없이 했다”고 덧붙였다.
아무책방이 주는 분위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즈넉함’이다. 고요한 분위기에서 서가에 꽂힌 책을 구경하고 책방지기와 책에 대해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책방지기의 바람도 책방의 분위기와 비슷했다. 부담감 없이 자주 찾아왔으면 하는 것이다. 원 씨는 “학생들은 책방에 들어오면 한 권은 사 가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며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란다. 들어와서 둘러보기만 해도 괜찮다”고 했다. 추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아무책방은 더 고즈넉해질 예정이다. 동네 책방 초심자라면 이곳을 입문하는 기점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


회기역 1번 출구 가까운 곳에 동네책방이 있다. 바로 ‘책방 오후다섯시’이다. 지난해 3월에 시작한 이 책방은 입구에서부터 아기자기한 느낌을 준다. 회기역 근처 건물 3층에 위치한 책방 오후다섯시는 다른 책방과 다르게 공간이 넓다. 사진 스튜디오와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스튜디오에 쓰이는 침대와 소파가 배치돼 있는 데다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책방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업실이나 집 같은 느낌을 준다.
특정 분야의 책을 다루는 것과 같은 독특한 컨셉은 없다. 넓은 영역의 책을 다루고 소규모 출판물도 다룬다. 김 씨는 출판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도, 글을 쓰던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회계 쪽의 일을 하던 회사원이었다. 친한 친구가 하는 스튜디오 공간이 이미 있었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독립 출판물로 작은 사진집을 만든 경험이 있었다. 스튜디오 창가 쪽에서 촬영만 하니까 남는 공간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 중에 독립 출판물을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번 팔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책방지기인 김다영 씨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큰 포부가 아니었고 그냥 내 책을 만들어서 직접 소개도 하고 궁금했던 책들이나 읽어보고 싶은 책들을 같이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김 씨는 4월까지 직장 일을 병행하며 책방을 운영하다가 5월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고 책방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책방의 이름은 다섯 시쯤 일찍 저무는 겨울 해를 보고 우연히 생각해냈다. 특별한 뜻이 없어 친구와 지인들이 계속 의미를 붙여 준다고 한다. 이런 독특한 운영자의 감성을 책방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책방 오후다섯시 특유의 다양한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이어지는 분필소리전’은 저자를 초청해 책에서 나누고 싶은 문장을 작가가 벽에 쓰는 기획전이다. 전시 기간에 저자와의 만남을 열어 독자와 작가의 소통의 장을 열기도 한다. 책방 오후다섯시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활동 일정과 입고된 신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좋아하는 저자가 온다면 한 번 가보는 것은 어떨까.


“어디에 속해있지 않고 혼자 운영한다. 혼자 하니까 24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다.” 책방지기의 입장에서 동네책방의 매력을 물어보니 아무책방의 책방지기 원주신 씨가 이렇게 답했다. 직장을 다니면 주어진 일을 해야 하니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대한 일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책방 오후다섯시’의 책방지기인 김다영 씨도 비슷한 답변을 했다. 김 씨는 “이전에 종사했던 회계 쪽 일은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며 “책방 일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사진집을 만들 수도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부담도 만만치 않다. 원 씨는 “아침에 눈 뜨면 막막하다. 그날 그날을 내가 다 결정하고 다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책방 운영에서 오는 부담을 다르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책방에서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 보람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동네책방을 하는 이유는 어떤 큰 포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원 씨는 “동네책방은 책방지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다. 직접 해보니까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사회에서 책방지기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동네책방은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늘 하루, 방문자가 돼 일상의 여유를 느껴 보자.
글·사진_ 김준수 기자 blueocean617@uo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