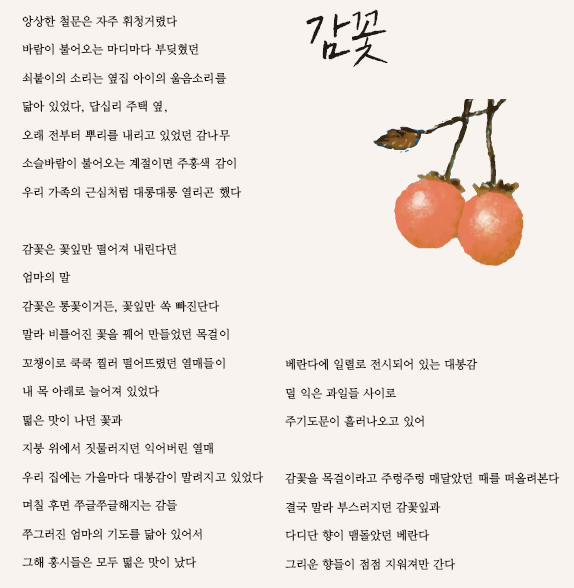
바람이 불어오는 마디마다 부딪혔던
쇠붙이의 소리는 옆집 아이의 울음소리를
닮아 있었다, 답십리 주택 옆,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감나무
소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면 주홍색 감이
우리 가족의 근심처럼 대롱대롱 열리곤 했다
감꽃은 꽃잎만 떨어져 내린다던
엄마의 말
감꽃은 통꽃이거든, 꽃잎만 쏙 빠진단다
말라 비틀어진 꽃을 꿰어 만들었던 목걸이
꼬챙이로 쿡쿡 찔러 떨어뜨렸던 열매들이
내 목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떫은 맛이 나던 꽃과
지붕 위에서 짓물러지던 익어버린 열매
우리 집에는 가을마다 대봉감이 말려지고 있었다
며칠 후면 쭈글쭈글해지는 감들
쭈그러진 엄마의 기도를 닮아 있어서
그해 홍시들은 모두 떫은 맛이 났다
베란다에 일렬로 전시되어 있는 대봉감
덜 익은 과일들 사이로
주기도문이 흘러나오고 있어
감꽃을 목걸이라고 주렁주렁 매달았던 때를 떠올려본다
결국 말라 부스러지던 감꽃잎과
다디단 향이 맴돌았던 베란다
그리운 향들이 점점 지워져만 간다
관련기사
양주고 김 예 림 作
press@uos.ac.kr

